
수습 활동가 3개월차, 불법계엄 사태와 맞닥뜨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출근한 지 3개월이 되었다. ‘우리 센터는 연말에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12월 2일, 점심을 먹고 돌아와 선배 활동가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생각난다. 1월에 있을 총회 준비를 하는 것 외엔 그렇게 바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벌써 아스라하다. 민중의소리 칼럼으로 무얼 쓸까 즐겁게 고민하던 시간도 멀게만 느껴진다(사실 실제로 멀다). 그 이튿날,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린 후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나 모르겠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선포 3시간째. 활동 6년차와 8년차 선배 활동가들이 국회를 지키러 뛰쳐나간 사이, 사무국장님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계엄을 선포할 때 개최해야 하는 국무회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의록을 통해 참여자와 그들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정보를 은폐할 일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답변은 상상치도 못한 채 말이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월 5일, 국무회의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작성된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 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는 행안부와 관련 있다’고 답했고,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답했다. 우리의 상대는 이런 수준이었다. 자기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대통령실, 자기네 장관이 참석했는데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의 책임을 놓은 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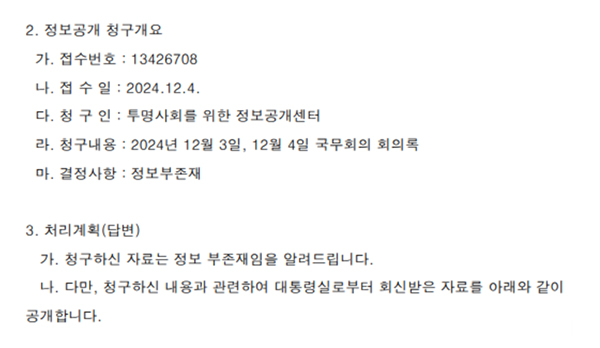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무회의라 부를 수 있는 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회의록 정보의 부존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인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보부존재’와 ‘있도록 만들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것인가. 단체톡방에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공유받고 나는 내심 생각했다. ‘정보부존재’라는 단어는 정보공개 활동가가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벽이었다. 요청한 기록이나 정보를 해당 공공기관이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명이다. 절에 가서 젓국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위 회의록처럼 마땅히 있어야 할 정보에 이 결정을 받으면 힘이 빠지게 된다. 없다는 데 더 이상 어쩔 것인가.
힘 빠지는 일은 하나 더 있었다. 국무회의와 같은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적 의무인데도 안 지킨 것이다. 우리의 상대가 이런 수준인데, 더 이상 뭘 어쩔 것인가.
그러나 노련한 우리 활동가들의 생각은 나와 달랐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에는 집회에 참석하느라 밤낮없이 바쁜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법률 조항처럼 단호한 문장에 동료가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자.”
‘만들자’. 그러고보면 나는 그 말에 이끌려 활동가라는 일에 덜컥 지원했다. 앞으로 어디선가 노동하며 살아야만 한다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고,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정보부존재’가 활동가로써 새롭게 알게 된 벽이라면, ‘있도록 만들자’는 새롭게 알게 된 길이었던 것이다.
다른 시민단체 후원주점에 참석한 채로 우리는 사흘 뒤 있을 집회 때 나누어줄 전단지,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전달할 서명 양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으로 찍어둘 걸 그랬다. 맥주와 감자튀김이 놓인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타자를 우다다 치고, 서로 들여다보며 문장을 거듭 고치는 모습을 떠올리니 웃기는데. 하여간 그렇게 만든 전단지를 집회에서 배포했다. 4천 장을 전부 뿌렸다. 같은 내용을 SNS에도 홍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부탁도 했다.
그렇게 지금은 2천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우리가 만드려는 세계에 시민들이 힘을 보태준 것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록과 증거를 남겨야만 하는 세계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초보 활동가인 나에겐 새삼스럽게도 뭉클한 일이었다. 길을 내면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구체적으로는, 늦은 저녁 후원주점에서도) 어쩔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내는 것이 정보공개 활동가의 소임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알 권리를 누리는 세계
윤석열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동참한 자들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반민주주의라는 죄를 지은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의록과 같은 기록은 시민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대이다. 기록의 생산과 공개는 권력 남용을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윤석열과 일당은 그 토대와 제도를 들어내 버린 것이다.
기록이 투명히 생산되고, 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기록을 남겨도 되지 않는 세계에서 집권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책임을 방기한다. 기록이 숨겨지는 세계에서 시민은 정치적 판단의 근거를 잃는다. 기록과 같은 정보를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 나와 동료 활동가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가 ‘알 권리를 누리는 세계’인 것은 그 때문이다.
활동가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계는 탄핵과 관련인 처벌 너머에 있다. 정보공개법이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세계로, 정보공개가 더욱 넓은 영역에서 투명히 이루어지는 세계로, 알 권리가 살 권리로서 보장받는 세계로 뻗어 있다.
짧다면 짧은 3개월의 막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도록 정신 없는 나날이었지만 세 가지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 정보공개 활동가란 ‘부존재’에 절망하지 않고 길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그 길에는 다른 시민들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픈 세계는,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며, 시민의 알 권리가 당연한 일상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 이 글은 민중의 소리 <공개사유> 칼럼에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