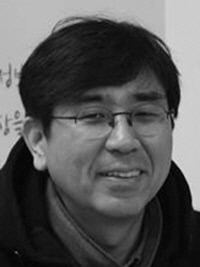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예비비 공개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공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한다. 화사한 파스텔톤 정부3.0 자료집에 실린 약속을 글자 그대로 믿은 게 실수였다. 자료집에 나온 ‘국민’은 내가 아는 국민이 아닌 듯하다. 부총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알권리는 어디로 접어둔 것인지 답답하다. 그나마 알리고 감추는 기준조차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단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궁금하다. 그 기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은 아닌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현실이 무섭다. 세월호, 메르스…. 때마다 어김없이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져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에 대해 “국민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 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은 스스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 공개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일까? 정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활동의 증거로, 그리고 이용을 위해 공개된다.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면 공개하면 그만일 것이다. 왜 감춰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스스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실종되었다. 이제는 받아내야겠다. 정부3.0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무지갯빛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 공개하겠다는 다짐을 되돌려 받아야겠다. 그리해야 우리가 살겠다. 알권리가 숨을 쉬겠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 칼럼은 <한겨레> 2015년 11월 5일자 “왜냐면”에도 게재 되었습니다.